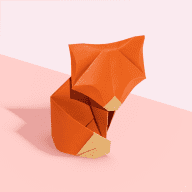4차 산업혁명의 버블
이전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거창하게 칼럼을 써 놓고, 이번에는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니 좀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행어처럼 퍼지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요즘을 잘 보이지 않네요. 마치 무언가 엄청난 변화라도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언론도, 학계도, 정치권도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피로감에서 인지, 이제는 마치 유행이 지난 패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행이 휩쓸고 간 스마트나 마라탕을 보는 것도 같은 건 저 뿐인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의 기원은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슬로건에서 시작했습니다. Industry 4.0 (독일어: Industrie 4.0)은 2011년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산업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타게 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대량생산에 밀려, 독일 산업이 설자리를 잃어감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한 산업관련 정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산업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주요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다품종 소량생산의 최신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4.0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날 수도록 마케팅 용어로 변질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Society 5.0(실상이 없고, 슬로건만 있음)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Made in China 2025” (2019년 정책 포기)이라는 것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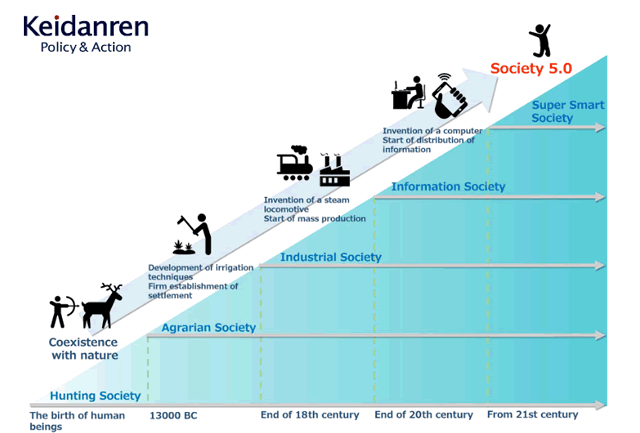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주장하고 진행했던 독일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은 실패라는 의견이 많고,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인더스트리 4.0 보고서를 보고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정책 치고는, 알맹이는 없고, 화려한 미사여구들로만 가득한 의미론적 보고서에서 불과했지요. 그래서인지 4차 산업혁명을 주장했던, 중국도, 일본도, 실체 없는 일에 매달리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인더스트리 4.0은 점점 경쟁에 내몰리는 독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국가 정책이었는데, 그러한 정책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마치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마케팅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4차 산업혁명 거품을 불러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유비쿼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한 때 유행처럼 퍼져갔던 이 용어는 ‘(신은)어디에나 널리 존재한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Ubiquitous’에서 온 것으로, 어디서든 컴퓨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컴퓨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세상… 많이 듣던 개념이지요? 한 때 유행했고, 지금은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하는 스마트 세상이 유비쿼터스 세상입니다. 스마트가 한창 유행일 때는 뭐든 상품이면 전부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스마트와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상품에도 마구마구… 요강도 스마트 요강이 있었다는 전설이…
스마트의 등장과 함께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신선하게 느껴졌던 단어들을 현장에서 직접 대하고 운영해 보면… 기존의 기술을 응용해 적절한 용어로 포장한 것 처럼 보입니다. 아주 뭔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IT서비스에 새로운 용어를 붙이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 유비쿼터스,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인 단어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용어 정의에 차이는 있겠지만, 마케팅과 유행을 따라 그저 흘러온 하나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혁명”은 없고, 말 잔치로만 끝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혁명적인 산업변화는 원래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바꿔가는 것. 작은 개선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혁명처럼 보이는 것이 “산업혁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